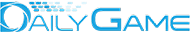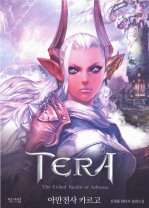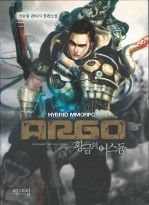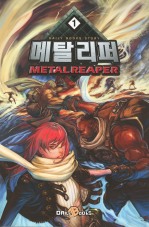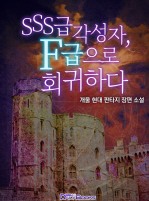![[이슈] 게임중독=질병? 과학적 근거 '아직 없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50218003754690_20160502180153dgame_1.jpg&nmt=26)
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는 게임과몰입과 게임문화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학술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게임패널 연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게임 과몰입의 원인과 영향력에 대해 사회과학 및 의학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방식인 게임패널에 대한 종단적 조사방법을 통해 연구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눈길을 모았다.
중앙대학교병원 한덕현 교수는 게임과몰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게임이 부정적이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립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특히 종적 연구는 없었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이슈] 게임중독=질병? 과학적 근거 '아직 없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50218003754690_20160502180154dgame_2.jpg&nmt=26)
그 동안 게임과몰입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게임을 많이 하는 그룹과 적게 하는 그룹을 구분해 뇌사진을 찍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정상인 상태에서 게임을 했을 때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정상인 사람과 뇌의 한 부분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게임을 했을 때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생물학적인 원인의 인과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
게임을 하면 도파민이 활성화되는데 전두엽에서 이를 통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과몰입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된다. 다만 이것은 추적 연구가 아니라 단면적인 것일 뿐이다. 원인결과를 따지려면 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교수는 ADHD와 게임과몰입을 연계해 2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게임에 과몰입한 유아, 청소년들을 연구한 결과 ADHD와의 연계성을 발견했다. 게임과몰입으로 병원에 오는 아이들 70%가 ADHD가 동반돼 있다는 것. 게임과몰입에서 핵심은 자기조절장애다. 자기통제가 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ADHD다.
![[이슈] 게임중독=질병? 과학적 근거 '아직 없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50218003754690_20160502180155_3.jpg&nmt=26)
김 교수는 정상군, 순수IGD(게임과몰입)군, IGD와 ADHD를 동시에 갖고 있는 군, 순수 ADHD군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ADHD군은 1년이 지난 후 전두엽의 피질 두께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IGD군은 특별히 전두엽의 감소가 눈에 띄진 않았지만 측후두엽과 두정엽의 피질이 두꺼워져있는 양상을 보였다.
김 교수는 "솔직히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나도 모른다"며 "뇌 피질의 변화를 좀 더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추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슈] 게임중독=질병? 과학적 근거 '아직 없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50218003754690_20160502180155_4.jpg&nmt=26)
게임과몰입과 관련한 생물학적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김 교수는 추적연구를 통해 IGD, ADHD 등 각 군의 아이들의 뇌피질이 깎여나가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정상적으로 뇌피질이 깎여나가는 시기이고, 건강한 아이들과의 깎임 정도까지 비교한 것은 아니다. 현상으로 인정할 뿐, 해석까지는 어렵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게임중독을 말할 때 공존병리를 생각해야 한다. 정신병리와 연계해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과 순수하게 게임을 통한 쾌감을 탐닉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사람 두 그룹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연구 결과에 따른 해석도 가능하다"며 "공존병리가 뒤섞인 상태에서 연구를 하고, 이게 게임 과몰입인지 공존병리 때문인지 모르는 걸 연구해놓고 해석까지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 국가가 관리한다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