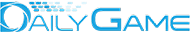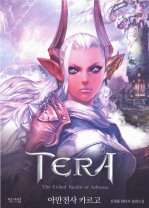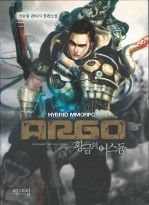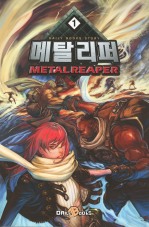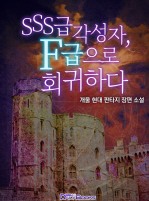연구 결과만 놓고보면 일단 게임의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게임이 가진 순기능과 운동 역학 관계를 실험에 옮겼다는 것 만으로 단순 게임이 얼마 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증명해 낸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쉬움도 따른다. 어쩌다가 게임이 본질적인 의미는 퇴색하고, 기능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업계 스스로 차별화를 두기 위한 전략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박 교수의 말이 백번 옳다고 본다. 지금껏 업계는 '두뇌 개발', '운동 효과' 등을 토대로 게임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애써왔다. 심지어 자사 게임을 강조하기 위해 비기능성 게임이 게임 중독을 유발하거나,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게임업계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현 사회에서 게임이 유해매체로 낙인 찍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업체 스스로가 목을 죄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게임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 먼저다.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것은 교육이나 기능적 역할이 아니라 즐거움 그 자체기 때문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편법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