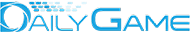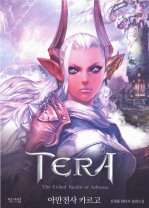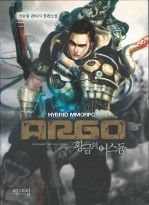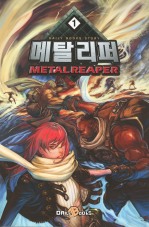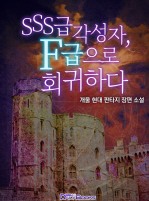DRM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이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수단이다.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인증키를 넣고, 온라인 인증을 받는 것 역시 DRM의 한 방식이다.
가전제품은 사용할 때마다 부품의 수명이 단축돼 중고로 구입하면 잦은 고장에 시달려야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신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좋은 중고 소프트웨어의 인기가 좋을 수 밖에 없다. 신품 소프트웨어 판매가 곧 업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콘솔 게임의 특성상 중고 거래 시장은 항상 문제가 됐었다.
'엑스박스원'과 '플레이스테이션4' 출시를 앞둔 이번에는 일이 커졌다. 온라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보급되고, DRM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시장 관여가 쉬워졌다. 다운로드 콘텐츠(DLC)처럼 지속 유지 가능한 비지니스 모델을 꿈꾸던 콘솔 게임 업체에게는 차려진 밥상처럼 보인다.
게이머들은 중고 게임 거래에 플랫폼 업체가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업체의 관여 없이 만들어진 시장의 순수성이 사라질 뿐 아니라 게이머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에서다.
DRM 찬성논자들은 밸브 '스팀'의 예를 들며 콘솔 중고 게임 거래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팀'에서 독점 서비스 되는 '하프라이프'는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돼 인증키를 재판매 할 수 없음에도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콘솔 왕국 일본에서는 중고 시장이 축소될 경우 신품 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소비자의 구매력에는 한계가 있고 중고 소프트웨어 재판매가 신품 구매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다.
업체는 생존과 직결되는 수익율이, 소비자는 돈을 지불하며 얻은 즐길 권리와 재산권의 대립이다.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집단의 싸움이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순간 콘솔 게임 유통 시장이 뿌리부터 달라질 기로에 서있다. 업계 종사자로서 어느 쪽에 손도 들어줄 수 없다. 단 한가지 확실한 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콘솔 게임 업체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