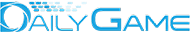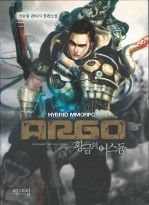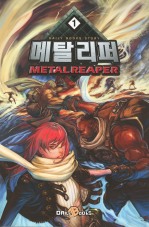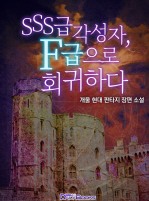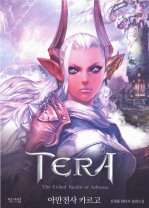박성호 의원이 내놓은 '상상콘텐츠 기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입을 맞춘' 결정판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맞춰, 여당후보가 법안을 내고 문화부가 뒤에서 밀어줬다. 그 내면에는 '이만하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겠지'라는 기대심리가 깔려 있는 듯 보인다. 실제로 이 법안이 알려진 후, 게임업계에서는 '과거 매출 1% 징수법안들은 양반이다'는 평마저 나온다.
게임업계는 법안의 모순을 지적하면 극렬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과 문화부가 노린 것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있다. 가령 '5%가 너무 많으니, 1%대로 기금을 낮추면 낼 수 있겠냐'는 협상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의 몇 %라든지, 기존 법안의 문제를 보강한 법안을 다시금 제시한다면 게임업계가 거부할 명분을 가질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게임규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만든 이러한 주장들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게임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게임죽이기'에 앞장선 언론과 정부에 의해 '게임 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대신 게임업체들은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곧 게임업체는 청소년을 중독시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뚜렷한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오해하게 되고,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조성하든 논리적으로 대응하든 해서 이번 5% 징수안을 어떻게든 벗어났다고 치자. 비슷하거나 더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분명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게임업계는 이번 일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규모의 자율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업계에서 판단하기에 합리적이고, 사회구성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기금을 스스로 마련해 이를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정치권이나 여론이 게임업계를 상대로 '삥뜯기'를 할 명분을 없애는 것과 더불어 해당 기금으로 왜곡된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활동을 펼칠 근간을 마련해 줄 것이다. 산업에 대한 발전에 사용하거나 일손이 딸리는 협회에 힘을 실어주는 등 쓸 곳은 다양하다.
다행히 게임협회 협회장이 정치권 영향력이 있는 남경필 5선 의원이다. 협회장이 나서서 동료 의원들에게 기존 법안에 대한 양해(법안 파기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구하는 대신, 회원사들에게는 ' 더 이상의 규제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