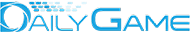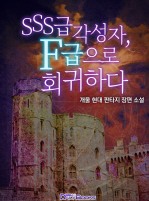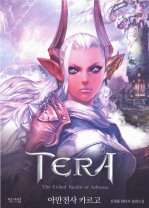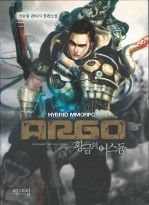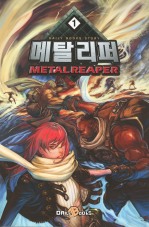해당 법안에 총대를 맨 이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뒤에서 지원사격하고 중독의학회, 정신과학회 등 의사단체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입법은 분명 세상을 좋게 만들자는 취지서 이뤄지는 것도 있겠다만 이권이 개입된 경우도 많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가 나서는 이유도 이권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장 중인 게임산업에 규제를 무기로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의사단체들은 게임중독을 진료과목에 넣을 수 있다.
손실이 많으니 중독을 치료하자는 것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면 필연적으로 치료비용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되면 게임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질병이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병원진료에 따른 부담은 국가든, 가정이든, 게임업체든 누구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다. 중독법으로 웃는 건 병원과 의사들이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의 핵심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마련 조항도 포함돼 있다. 결국은 게임업체들에게 기금을 징수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의사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겠다는 의도다.
또 하나, 게임 중독법은 무관심과 소통부재로 인해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에 대한 부모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자녀들이 게임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아닌 게임 자체에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된다. 이는 곧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게임회사에 떠넘길 수 있는 명분으로 이어진다. 터무니없는 중독법이 일부 사회단체로부터 지지를 얻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속내 앞에서 게임산업이 수출효자고 미래창조산업이라 말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애당초 연초에 매출에 1%를 강제징수 하겠다는 손인춘법이 발의됐을 때, 중독법은 예견된 사안이었다.
게임업계는 반박 논리 자체를 바꿔야 한다.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에 연장선상에 놓는 것에 화낼 것이 아니라, 이 중독법으로 인해 어떤 조직과 단체가 수혜를 입을 것인지를 명확히 알리고 그 이권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심리학자 집단이나 교수를 지지층으로 흡수해 게임중독이라는 것이 병리적인 현상인지, 사회적인 현상인지를 먼저 따져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중독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임업계 주장을 ‘제 살자고 이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