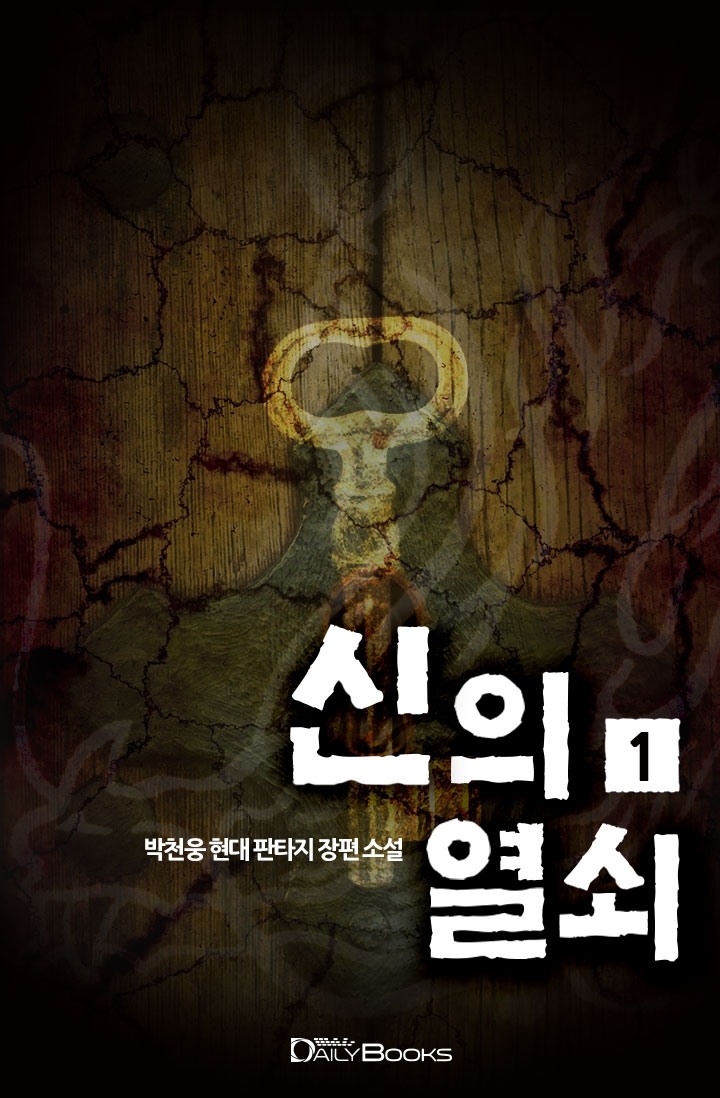
7. 신체의 변화(1)
아리가 한 말에 충격을 받은 강일은 신의 선물 상자를 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다.
강일은 하백의 임무만을 완수하고 구리 열쇠를 받는다고 해서 상자만 열지 않으면 된다고 여겼다.
어차피 신의 선물 상자 또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미 강일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상황에서 보답은 충분할 정도로 받은 상태였다.
강일은 어쩌면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할 정도였다.
“일단 이 걸로 남은 빚을 갚자.”
강일은 아리로부터 받은 오백만원을 학자금 대출부터 갚기로 했다.
자동차의 상향등 때문에 여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분명 그녀는 자신에게 그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할 것이 분명했다.
그 요구가 뭐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다.
정 자신이 들어 줄 수 없는 요구라면 돈으로라도 갚아야만 했다.
더 이상 피하며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강일이었다.
“후우! 첨첨산중이네. 그래도 아리 씨로부터 받은 돈이 큰 도움이 되네.”
정말 더 주기로 한 이천만원이 더 들어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손에 있는 오백만원만으로도 강일에게는 감지덕지했다.
지금 강일에게는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정말 다행인 일이었다.
아니, 설령 안다고 해도 공청석유가 뭔지 모르니 강일로서는 오백만원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
강일은 그렇게 은행으로 달려가 얼마간 생활비를 남기고서는 전부 빚을 갚아 버렸다.
물론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아니었지만 계속 들고 다니다가는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626만 3210원 남았네.”
상당히 많이 갚은 것 같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진 것에 강일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다.
한 달에 20몇 만원씩 줄어드는 걸로는 평생이 가도 갚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드는 금액이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빚은 더 늘어나 있을 터였다.
그나마 학자금 대출이라 다른 빚보다 이자가 작다는 것이 위안일 뿐이었다.
“그래도 이제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어차피 너무 늦어 버린 시간에 강일은 할 일이 없어졌다.
새벽 알바를 찾아보았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찾을 수가 없었다.
“후우! 오랜만에 산책이나 할까? 머리도 복잡하고 말이야. 가끔 이렇게 머리를 식혀 주는 것도 필요하지.”
결국 강일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에 그냥 한강이나 산책 삼아 걷자는 생각을 했다.
강일은 강을 좋아했다.
그냥 취향일 수도 있었지만 강일은 옛날부터 강을 좋아했다.
물론 그런 자신이 강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멍하니 한강을 바라보며 걷다보면 시간이 훌쩍 가 있었다.
그 시간 동안은 고민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며 강일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돌아가자.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힘내자 강일!”
몸은 가뿐했다.
마치 새 몸을 받은 것 같은 느낌마저도 들고 있었다.
강일은 그런 느낌이 천연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천연화에 쏟아버린 액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액체 때문에 천연화가 다시 살아났고 그 천연화가 자신의 몸의 피로를 풀어 줬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런 강일의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강일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몸에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말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빨리 강일은 그 변화를 알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까아악! 이거 놔요!”
“어허! 이봐 아가씨!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냥 같이 좀 놀자고!”
“크크큭! 그래! 우리 돈 많아! 나이트 갈까? 응?”
“싫다고요! 제발 놔줘요!”
한 젊은 여인이 두 명의 건달의 손에 붙잡혀서는 희롱을 당하고 있었다.
밝은 대낮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지만 조금 어두워지는 저녁 시간대에 으슥한 곳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었다.
물론 강일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괜히 끼어들어 봐야 좋을 것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비겁한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해서는 괜한 고생만 하게 될 터였다.
“구해 주세요!”
“뭘 봐! 새끼야! 안 꺼져!”
산책을 하고 있던 다른 이들도 두 건달의 험악한 욕설에 고개를 돌리고서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강일도 그런 사람들처럼 모른 채하며 지나치려고 했다.
“제발! 놔주세요! 제발!”
“어허! 누가 잡아 먹는데? 어? 이 여자가 진짜! 우릴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드네.”
강일은 뒤 쪽으로 들리는 젊은 여인과 건달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분명 그냥 지나쳐야만 한다고 머리로는 여기고 있었지만 가슴은 요동을 쳤다.
왜 그런지는 강일도 몰랐다.
그냥 심장이 터져 버릴 것처럼 요동을 쳤고 강일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더니 뒤로 움직였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미쳤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강일은 그런 이성을 무시한 채로 외쳤다.
“이봐요! 그만 둬요!”
“……?”
“……!”
강일은 그 말을 하면서도 후회를 했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강일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젊은 여인과 두 건달의 고개가 돌려졌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몸을 덜덜 떨고 있는 강일을 볼 수 있었다.
“풋! 뭐야? 저 새끼! 무슨 지가 정의의 사도야 뭐야?”
“어쭈! 덜덜 떠네. 저 새끼! 야! 그냥 꺼져! 뒤지고 싶지 않으면.”
“도……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일은 한숨을 내쉬고서는 고개를 들어 외쳤다.
“그 아가씨 놔 줘요. 좋은 말 할 때.”
“푸하하하하!”
강일의 말에 명백한 비웃음이 들어 있는 웃음소리가 터졌다.
“꺼져라! 우리가 좋은 말 하기 전에.”
“미친 새끼.”
더 까불다가는 재미없을 것이라는 말에 강일은 한 걸음 내딛었다.
‘천연화만 있으면 상처도 회복되니까.’
비록 그리 빠르게 아물지는 않았지만 분명 상처도 치료가 되는 것을 아는 강일이었다.
그렇기에 강일은 무턱대고 머리를 들이 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뭐야? 이 새끼가! 죽고 싶나?”
“죽여 봐! 새끼야! 죽여 보라고!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
강일은 건달의 말에 오기가 생기는지 몸을 들이 밀면서 죽여보라고 외쳤다.
“씨발! 사내 새끼들이 여자 한 명 붙잡고 괴롭히기나 하고! 한 번 죽여 봐! 어차피 두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세 번이라고 못하겠냐? 죽여 봐! 새끼들아!”
어차피 강일 자신의 삶은 밑바닥이었다.
잃을 것도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이 새끼가!”
“죽고 싶어?”
강일의 행동에 당황하는 것은 오히려 두 건달들이었다.
설마 이렇게 막무가내로 달려들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이었다.
대충 겁을 주면 대부분은 도망치기에 바빴다.
“씨발! 쳐보라고! 죽여! 개새끼들아!”
“진짜! 이 새끼가!”
하지만 그들 또한 막장 인생은 마찬가지였다.
퍼억!
있는 힘껏 강일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지르는 건달의 주먹에 강일의 머리가 돌아갔다.
지끈!
통증과 함께 강일은 인상을 찡그렸다.
곧바로 자신의 몸이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건달로부터 구타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각오를 했다지만 정말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덜컥 겁이 났다.
“별 것도 아닌 새끼가!”
강일에게 주먹을 내지른 건달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이내 당황해야만 했다.
“…….”
강일은 분명 주먹에 얼굴을 맞았고 통증을 느꼈는데도 왠지 견딜만한 것에 의아해졌다.
분명 아픈 것 같기는 한데 참을 만 한 것이었다.
‘뭐지? 별로 안 아프다?’
강일은 돌아간 고개를 똑바로 하며 인상을 쓰고 있는 두 건달을 바라보았다.
퍼억!
또다시 주먹이 날아들었다.
강일은 그 주먹에 이번에도 맞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통증도 없는 것에 고개조차 돌아가지 않았다.
‘뭐지? 왜 안 아파? 아니, 아프긴 한데 꼭 애들 장난 같은?’
있는 힘껏 맞은 주먹에 별다른 타격도 받지 않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강일에 두 건달들은 놀란 눈을 했다.
“뭐야? 이 새끼는?”
“너 진짜 죽고 싶어?”
강일은 뭔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맞아도 별로 타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강일의 입가에서 비웃음이 세어 나오기 시작했다.
“뭐야? 주먹 좀 쓰는 놈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동네 양아치 새끼들만도 못하잖아.”
“뭐? 너 죽고 싶어!”
다시금 주먹이 날아왔지만 강일은 왠지 그 주먹이 무척이나 느리다는 느낌과 함께 자신이라면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부웅!
그리고 그런 주먹을 강일은 너무나도 쉽게 피할 수 있었다.
강일조차 건달의 주먹을 피한 것이 얼떨떨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주먹이 날아오는 것에 무척이나 쉽게 피해 버렸다.
“하아! 나도 한 번 쳐 볼까?”
강일은 얼굴이 시뻘게진 채로 자신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는 두 명의 건달들을 보며 자신의 주먹으로 후려쳐볼까 하는 생각을 직접 말로 하고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싸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새끼! 너 운 좋은 줄 알아! 나중에 보면 그때 죽을 줄 알어!”
“그……그래! 이 새끼야!”
두 건달들은 경찰차가 보이자 곧바로 도망을 치며 강일에게 협박을 하고서는 도망을 가버렸다.
강일은 그런 두 건달들에 허탈해졌지만 두 건달과 마찬가지로 이미 사라져 버린 젊은 여인에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인가? 뭐 도와달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의 인사 정도는……·. 후우! 아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위험에서 도와줘도 그냥 도망을 가 버려서 피해를 입는 남자들의 이야기와 같은 상황이었다.
강일은 주먹을 맞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서는 자신의 고시원으로 향했다.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드는 강일이었다.
“그래도 때 맞춰 경찰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다행이네.”
강일은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어쩌면 그것은 정말 다행일 수도 있었다.
강일이 만일 두 건달을 향해 있는 힘껏 주먹을 내질렀다면 두 건달의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 버렸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었다면 의도와는 달리 강일은 살인자가 되어 버렸을지도 몰랐다.
아직 내력은 쌓이지 않았지만 강일의 신체는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신체가 되어 있었다.
더욱이 근골이 강해지고 기골이 장대해지면서 과거와는 달리 상상도 못할 완력과 근력이 생긴 상태였다.
그것이 강일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될지 아니면 나쁜 일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강일의 신체는 확실하게 변화고 있었다.
박천웅 작가





































